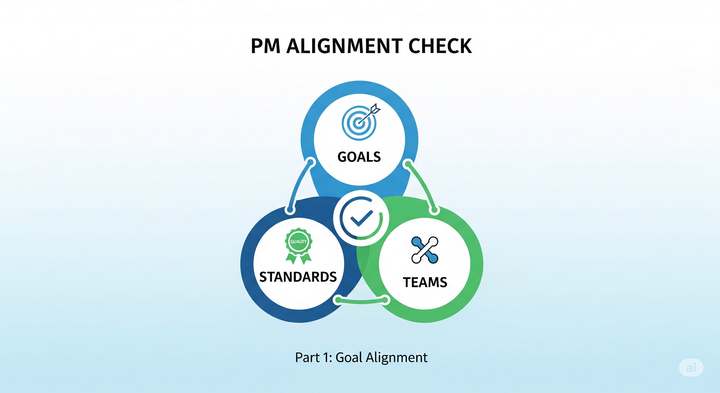AARRR을 뒤집어 만든 B2B SaaS 프레임워크, RRCAA
2개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갱신율이 높다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더 많은 제품을 쓰게 하면 되겠네!"라는 단순한 접근은 실패했어요. 고객 여정을 시각화하고, 행동을 쪼개고, 분석하면서 AARRR을 뒤집은 RRCAA 프레임워크를 정리했습니다. B2B SaaS에서 Northstar metric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갱신하는 고객들은 무엇이 다른가?
제가 속한 레몬베이스팀은 기업이 사용하는 성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위 말하는 B2B SaaS 제품을 만들고 있죠. 이런 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1~2년 정도의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둔 계약을 해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재구매)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팀은 당연하지만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2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갱신율이 단일 제품 사용 고객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죠.
오, 그럼 고객들이 더 많은 제품을 쓰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후에 갱신/이탈 트렌드를 살펴보니 복수의 제품을 쓰는 고객들 역시 이탈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에서도 그 수준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평가를 쓰는 고객이 OO제품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계속 논의하는데, 무너가 논의 지점들이 산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고객의 여정을 나름의 멘탈 모델 하에서 이해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하나의 플로우를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자의 플로우를 하나로 정리 했습니다. 저와 제품별 PO가 줌에서 만나 같이 시각화 도구(당시에는 whimsical)를 켜고 고객의 워크플로우를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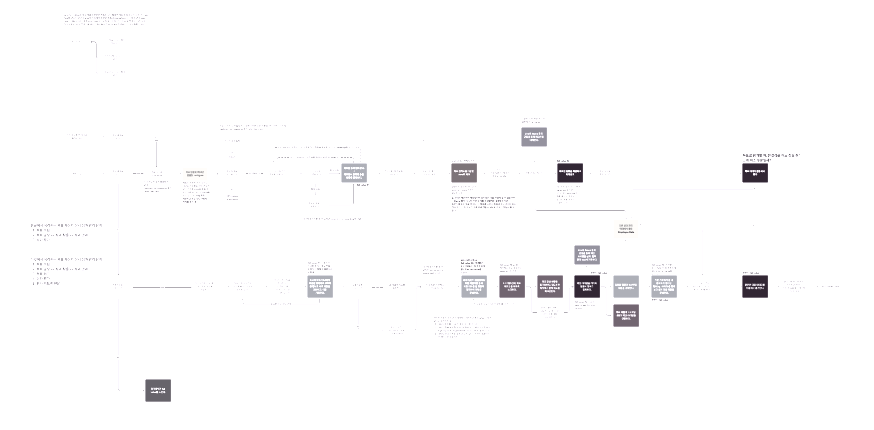
평가를 쓰는 고객이 어떤 단계를 거칠지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잘하면 고객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인사이트가 필요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 조직 내부에서 목표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고객의 결정)
그 다음은 2x2 매트릭스를 여러 개 그리고, 게속 쪼개고 새로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고객과 고객의 행동을 쪼개고 또 쪼갰죠. 제품 사용 깊이 vs 조직 규모, 활성 사용자 수 vs 라이선스 수... 이런 매트릭스들을 계속 그리면서 겹쳐보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고객 세그먼트가 명확해졌습니다.

RRCAA 프레임워크의 탄생
이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AARRR 프레임워크(Dave McClure의 해적 지표)가 우리 비즈니스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2B SaaS, 특히 갱신이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Acquisition보다 Retention이 훨씬 중요했거든요.(사실 이건 B2C도 매한가지죠. Retention is King!!)
그래서 AARRR을 뒤집어 RRCAA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퍼널의 순서는 해적 지표와 동일합니다. 😄
- Repurchase (Business Outcome - 재구매/갱신)
- Retention (Product Outcome - 사용자 유지)
- Cross-Activation (OO 제품과 평가 제품 둘 다 활성화)
- Activation for Action B (OO제품의 B 행위 완료)
- Activation for Action A (OO제품의 A 행위 완료)
해서 이제는 각 단계마다 전환율을 측정하고, 병목 구간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팀이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쓰게 하자."라는 다소 넓은 목표였다면, 이제는 "OO제품을 쓰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OO 제품 내에서 Action A와 B를 마치게 하는게 중요하고, 우리는 A 단계까지의 전환율 XX%를 타깃한다."로 바뀌는 것이죠.
둘째, 성과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퍼널이 개선되고 있고, 어느 퍼널이 정체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였죠. 덕분에 어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더 잘 보이니까 CSM들이 어떤 고객을 컨택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OO' 제품을 쓰기 전에 보이는 행동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플로우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보고 있는 대시보드가 아직도 계속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저희가 고객을 한 번에 다 파악하지 못 한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지만...그만큼 unknowns to unknowns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4가지 조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좋은 프레임워크와 지표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고객의 실제 행동 패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통 지표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지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 화면을 개선하면 작성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 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작성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대신 작성하는 내용의 질과 양이 늘어나기도 하죠. 고객의 실제 행동을 면밀히 쪼개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지표만 잡으려고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둘째, 팀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RRCAA는 복잡한 통계 모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갱신을 위해서는 여러 제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아무리 정교해도, 팀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B2B SaaS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지표는 Willingness to Pay(지불 의향)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WTP는 정말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옳더라도 실제로 측정하고 추적하고 관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고, 저는 그냥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지표를 선택했습니다.완벽하지 않더라도 측정 가능한 지표가 측정 불가능한 완벽한 지표보다 낫습니다.
넷째, 선행 지표여야 합니다. ARR이나 갱신 같은 후행 지표는 결과를 보여줄 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OO 제품 첫 방문율" 같은 선행 지표는 구체적인 액션으로 연결됩니다.
시각화, 프레임워크, 지표는 정렬(align)을 위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팀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 우선순위가 각자 아는 정보 하에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정렬(align)이 잘 안 되었죠.
고객 여정을 시각화 하고, 이를 프레임워크로 단순화 하고, 결과를 지표로서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서 정렬(align)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B2B SaaS를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northstar metric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B2C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정말 잘 워킹하지 않았고, 저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언젠가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어설프나마 고객의 행동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모아서 시각화 해서 정리하고, 이를 단순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지표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2년 동안 반복하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B2B SaaS, 특히 Seasonality가 큰 제품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B2B SaaS PO, PM 분들은 언제든 ahn.changyeong@gmail.com 으로 메일을 주세요. 😃